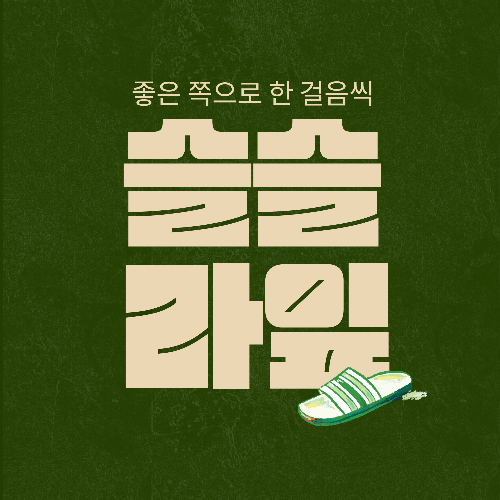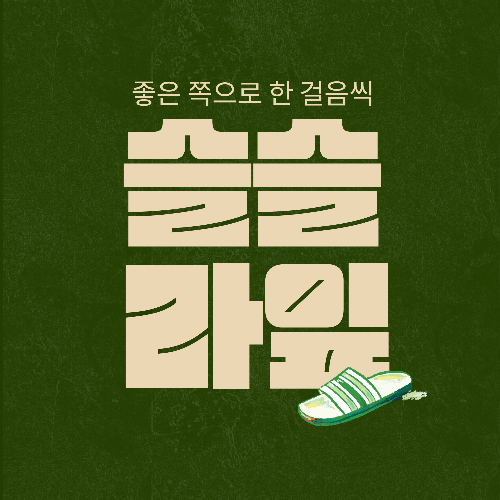올 것이 왔다! 안전성 평가
안녕하세요. 님,
‘안심하고 예뻐지자! Beauty. Safety.’
아로마티카의 2018년 TV광고입니다. 슬록의 CD님께서 당시 카피를 쓰셨는데요. 그린, 내추럴, 클린에 대한 개념조차 구분이 안되었던 그 당시에도 아로마티카 대표님께선 이미 ‘안전(Safety)’을 브랜드의 핵심 가치로 삼고 계셔서 놀랐다고 합니다. 당시 화장품 광고에선 다소 낯선 표현이었지만, 이제 ‘안전’은 글로벌 뷰티 시장의 기본 전제로 자리 잡는 분위기입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입법화
정부는 최근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이 제도는 화장품을 판매하기 전, 책임판매업자가 성분과 제품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026년부터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에는 연 생산·수입액 10억 원 이상 업체부터 우선 시행되고, 2031년부터는 모든 업체로 확대됩니다. 사전 안전관리가 본격화되는 거죠.
글로벌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수출도 어렵다
지금까지 국내는 판매 이후의 사후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췄다면, 세계 시장은 이미 사전 관리와 규제 강화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유럽(EU)은 2013년, 미국은 2023년 MOCRA를 통해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했고, 중국도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2024년 글로벌 화장품 수출 상위 10개국 중 7개국이 이미 안전성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K-뷰티는 명성에 비해 시작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하나
안전성 평가 제도는 판매 전, 제품에 대한 성분 정보, 물리·화학적 특성, 독성자료, 유해사례, 주의사항 등의 안전성 정보를 평가자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검토·승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료는 식약처에 제출하지는 않지만 필요시 점검 과정에서 식약처가 요청을 하면 제출을 해야 합니다. 평가자의 자격도 학위·경력·교육 이수 등을 기준으로 세부 요건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수입 화장품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소규모 비누 공방이나 수입대행형 책임판매업자 등은 일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규제인가, 기회인가
주변 반응은 엇갈립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는 반응과, 결국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 공존합니다. 책임판매업체 수는 2024년 기준 32,000개인데 대다수가 소규모 브랜드입니다. 내부에 안전성 평가자를 두거나 혹은 외부기관에 평가를 위탁하는 데 드는 돈이 무척 부담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야 하는 브랜드사로서는 안전성이라는 방향성을 거스를 수 없다는 점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제도가 산업과 조화를 이루기위해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자발적, 선제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에게는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K-뷰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
최근 PFAS(과불화화합물)에 대한 규제가 유럽(EU)과 미국 일부 주정부를 중심으로 화장품은 물론 식품 포장재, 섬유, 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흐름으로, ‘안전성 평가 제도’라는 큰 틀 아래 PFAS, 미세플라스틱, 나노물질 등 성분 단위의 리스크까지 세밀하게 관리하자는 방향이 글로벌 안전성 관리체계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규제 대응 차원에서 안전성 평가를 최소한으로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성분 단계부터 제품 전체에 이르기까지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인가” 브랜드사에게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